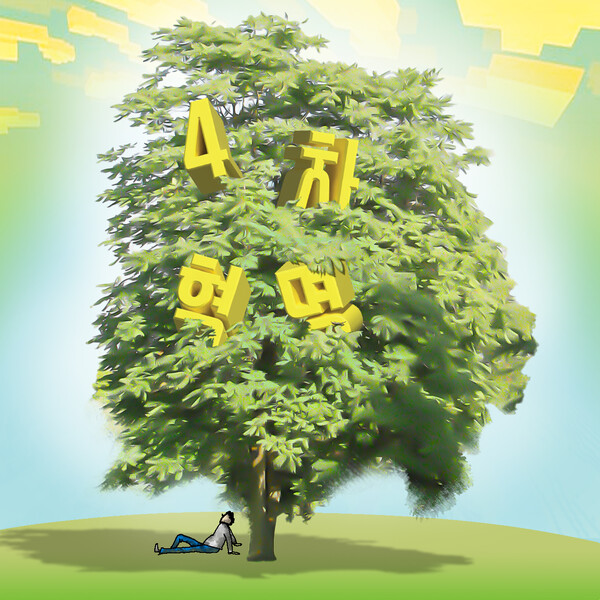
[뉴스드림=김해인 논설위원] 며칠 전 일요일 KBS의 진품명품을 보는 중에 쥘부채 한 점이 출품되어 나왔다.
저민 쇠뿔에 화려한 색깔을 물들여 만든 화각으로 장식한 화사한 겉대가 눈길을 끌었다. 그 안으로는 선홍빛의 화려한 선면이 펼쳐지고 선면 위로는 선비의 품격을 드러내는 멋진 그림과 화제가 나타났다.
출연자중에 한 사람이 낙관 중에서 소치라는 글자를 읽어냈는데 다름아닌 우리나라 19세기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의 호이다.
소치는 1839년 서른의 나이에 해남에서 상경하여 추사 김정희로부터 남종화의 거두 황공망과 예찬 등의 그림을 배운다. 추사는 그의 그림을 평하여 “압록강 동쪽으로 소치를 따를 만한 화가가 없다”고 하고 원 4대가중 한사람인 황공망의 호인 대치(大痴)를 본떠 소치(小痴), 즉, 작은 바보라는 뜻의 호를 내렸다.
1269년에 남송의 상공업 중심지인, 현재의 소주 상숙시에서 태어난 황공망은 열두살에 조국이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원제국에서 가장 낮은 지위인 남송 출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 성인이 되어서는 과거제도가 없어진 현실속에서 경사와 제자백가를 통달하여 조맹부와 같은 명사들과 교류하면서도 생계를 위해서는 하급관리로 일했지만 그마저 상관의 부패에 연좌되어 파직, 투옥되는 것으로 끝났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47세에 친구인 정저의 권유를 받고 도교의 신흥종파인 전진교에 입교하고 50세에 그림을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향후 오백여년간 문인화가들의 전범이 되는 서화론인 사산수결을 저술했는데 이 무렵에 대치학인 (大痴學人), 또는 대치도인(大痴道人)이라는 호를 쓰기 시작한다.
생각해보면 지식인의 활동 영역이 극도로 제한된 원제국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황공망은 자신의 지식이 현실적인 용도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대치라는 그의 호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현실 생활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의미로 붙인 자호였을 것이고 호에 덧붙인 학인, 또는 도인이란 단어는 수양을 통해 삶의 방식을 고양하여 완결하려는 다짐이었을 것이다.
황공망은 1348년 80세에 이르러 도반 정저와 항주 근교의 부춘강 가에 거처를 정하고 부춘산 풍경을 그리기 시작하여 3년에 걸쳐 여섯 장의 화선지를 이어 붙여 그림의 대강을 완성한 다음 발문을 쓰고 이후 4년간 세부를 다듬어 완결 지은 후 죽는다.
이 그림은 실경과 사의를 모두 아우른 남종화의 걸작으로 이후 동아시아 산수화에 주제, 구도, 기법면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작가가 분명한 모방작은 물론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다수의 모작이 세상에 나왔는데 위작인 자명권을 진본으로 판정한 청 건륭제의 위세에 눌려 청나라가 존속하던 불과 백여 년 전까지도 진본을 가려내지 못했다. 최근에 진본으로 판정된 무용사권은 그림의 끝부분에 황공망 자신이 친구인 무용사를 위해 그림을 그렸다고 명기하고 있다.
무용이란 이름은 장자 소요유 편의 마지막에 나오는 가죽나무 이야기에서 나왔다. 장자의 친구가 자기 집에 가죽나무가 있는데 쓸모가 없다고 불평하자 장자는 그 나무를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심어 두고 그 주위를 거닐면서 그 밑에서 잠을 자면 좋지 않겠냐 하면서 가죽나무는 쓸모가 없기때문에 잘리는 화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저의 이름, 저는 가죽나무라는 의미이고 이 이름의 성질에 맞춘 자(字)가 바로 무용이다.
황공망이 자호를 대치로 한 것은 정저의 자 무용에 맞춘 것이리라.
두 사람은 부춘강 가에서 “산중에 머무르며 구름처럼 바깥으로 다녔으며”(부춘산거도 발문), “삿되고, 달콤하고, 속되고, 의지하는 네 가지를 버리는”(사산수결) 삶을 살았다.
이들이 삶과 작품을 통해 제시하는 “아무것도 없는 곳(무하유)에서”, “그저 거닐며(소요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삶은 4차산업 혁명이 초래할 새로운 미래에서 가장 필요한 삶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